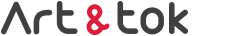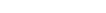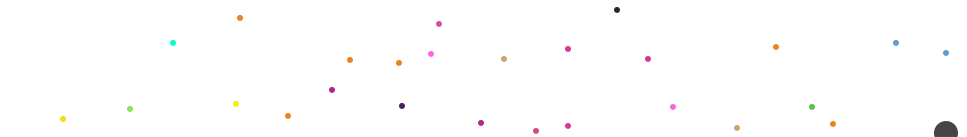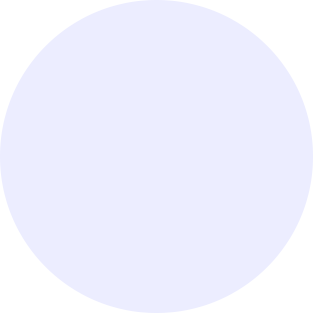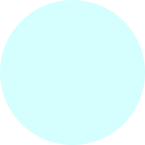Home > EXHIBITION
삭과 망
| 작가 : 이이령 | |||
| 분류 : 개인전 | 장르 : 서양화 |
 0 0
|
|
| 전시기간 : 2023.11.24 ~ 2023.12.22 | |||
전시 개요
잊혀진 이름. 조강(祖江).
그 곳은 강과 강이 만나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태백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 드는 한강은 개성과 파주 사이에서 내려오는 임진강과 만난다. 이 물줄기는 예성강과 염하를 품은 서해의 바닷물을 만나 김포 애기봉 유역에 크고 넓은 거대한 강을 이룬다. 그 어원과도 같이 조상강, 할아버지강(할아비강), 큰 강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조강(祖江)은 조수 간만의 시간을 재는 근본이 되는 강이라 시초, 시작을 상징하기도 한다.
해수와 담수의 영향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수많은 철새들이 쉬어 가는 이곳은 생태의 보고이자 생명의 강이다. 과거에는 10여개 나루터가 있었고, 그 중 조강포가 가장 번창한 곳이었다. 조강포가 있는 조강리에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100여 호가 밀집해 사는 큰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지역은 오랜 시간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역동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분단 이후 이곳은 한강하구 중립수역, 비무장지대(DMZ)로 지정되어 닫힌 공간,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다. 조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 월곶면의 조강리와 개성 개풍군의 조강리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물길은 막힌지 오래다.
고양시에 거주하며 김포와 파주를 종종 오가던 나는 언젠가부터 강과 철책이 보이면 지도를 찾는 습관이 생겼다. 강 너머로 보이는 곳이 이북인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곤 한다. 생각보다 그곳은 먼 곳이 아니었고, 저기와 여기 사이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기 전부터 흐르던 할아비강(祖江)이 있다. 과거의 역사들을 떠올리며 이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웅장해져 자주 이 장소를 찾게 되었다.
조강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곳이라 사리때는 강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강물이 들고 나고, 철새가 오고 가고, 강 너머가 보일 듯 말 듯한 이 곳에서는 보이는 것들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사진을 찍고, 망원경을 보며 렌즈를 통하는 눈빛들에서 간절한 바람들이 서서히 차오르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듯하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은 풍경들 속에서 달을 바라보며 기도하듯이 사진 촬영을 한다.
물에는 경계가 없다. 하지만 할아비강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다. 강물은 과거의 기억만을 품고 유유히 흘러간다. 철조망 너머로 조강(祖江)이 보인다. 그리고 그 너머로 개풍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일렁인다. 만선의 황포돛배와 조강물참 노랫소리가 밀물처럼 밀려오다 실향민들의 애통한 마음에 썰물처럼 지워진다. 인적 없는 논밭 위의 철새만이 이곳과 저곳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강과 강이 만나 더 큰 강물을 이루듯이 조강(祖江) 물길이 다시 열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단절된 과거와 미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그 곳은 강과 강이 만나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태백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 드는 한강은 개성과 파주 사이에서 내려오는 임진강과 만난다. 이 물줄기는 예성강과 염하를 품은 서해의 바닷물을 만나 김포 애기봉 유역에 크고 넓은 거대한 강을 이룬다. 그 어원과도 같이 조상강, 할아버지강(할아비강), 큰 강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조강(祖江)은 조수 간만의 시간을 재는 근본이 되는 강이라 시초, 시작을 상징하기도 한다.
해수와 담수의 영향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수많은 철새들이 쉬어 가는 이곳은 생태의 보고이자 생명의 강이다. 과거에는 10여개 나루터가 있었고, 그 중 조강포가 가장 번창한 곳이었다. 조강포가 있는 조강리에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100여 호가 밀집해 사는 큰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지역은 오랜 시간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역동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분단 이후 이곳은 한강하구 중립수역, 비무장지대(DMZ)로 지정되어 닫힌 공간,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다. 조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 월곶면의 조강리와 개성 개풍군의 조강리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물길은 막힌지 오래다.
고양시에 거주하며 김포와 파주를 종종 오가던 나는 언젠가부터 강과 철책이 보이면 지도를 찾는 습관이 생겼다. 강 너머로 보이는 곳이 이북인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곤 한다. 생각보다 그곳은 먼 곳이 아니었고, 저기와 여기 사이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기 전부터 흐르던 할아비강(祖江)이 있다. 과거의 역사들을 떠올리며 이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웅장해져 자주 이 장소를 찾게 되었다.
조강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곳이라 사리때는 강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강물이 들고 나고, 철새가 오고 가고, 강 너머가 보일 듯 말 듯한 이 곳에서는 보이는 것들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사진을 찍고, 망원경을 보며 렌즈를 통하는 눈빛들에서 간절한 바람들이 서서히 차오르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듯하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은 풍경들 속에서 달을 바라보며 기도하듯이 사진 촬영을 한다.
물에는 경계가 없다. 하지만 할아비강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다. 강물은 과거의 기억만을 품고 유유히 흘러간다. 철조망 너머로 조강(祖江)이 보인다. 그리고 그 너머로 개풍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일렁인다. 만선의 황포돛배와 조강물참 노랫소리가 밀물처럼 밀려오다 실향민들의 애통한 마음에 썰물처럼 지워진다. 인적 없는 논밭 위의 철새만이 이곳과 저곳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강과 강이 만나 더 큰 강물을 이루듯이 조강(祖江) 물길이 다시 열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단절된 과거와 미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전시 작품
-
돛배
-
떼
-
전당대